제비 심장 (김숨 지음 / 문학과지성사 / 384쪽 / 1만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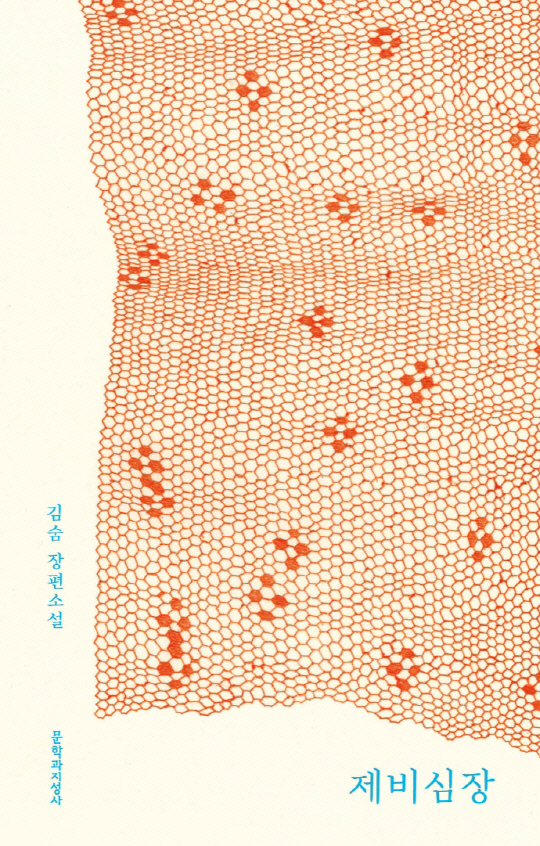
입양아, 철거민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 이주 고려인까지, `제자리에서 뿌리 뽑힌 사람들`에 주목해온 저자는 이번 작품에서 사려깊으면서도 집요한 시선으로 조선소 하루살이 노동자의 삶을 뒤쫓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은 병들고 아프거나 죽는다. 도장공들은 페인트와 시너 냄새에 피부가 일그러지고 후각을 잃는다. 발판공들은 철상자 안의 공중누각을 짓다가 추락한다. 용접공들은 강한 불꽃에 시력이 손상되고, 조선소에서 가장 고되다는 포설공들은 전선의 무게 탓에 손목 인대가 파열되고 근육이 늘어나며, 죽기도 한다. 이처럼 조선소 노동 현장에는 피할 수 없는 사고와 은폐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작품의 주요 배경인 `철상자`는 조선소에서 만드는 철배의 조각이다. 60여 톤에 달하는 철상자 300여 개를 조립해 연결하면 철배가 탄생한다. 철배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철상자는 중간착취의 욕망 아래 부품처럼 쉽게 쓰이고 소모되는 노동자들의 운명을 암시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철상자 안에서 길을 잃는다. 작업을 끝내고 철상자에서 나오던 `선미`는 그 안에 갇혀 죽음을 맞는다. `나`는 당시 선미의 짝이었던 `최 씨`를 보며 그가 한 번쯤 뒤를 돌아봤다면 선미가 철상자 안에 혼자 남겨져 길을 잃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마침내 `하루살이 노동자인 우리는 조선소에서 유령과 같아 실은 철상자 안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들은 철상자 안에서 평생을 보내지만 철배를 본 적이 없다. 조선소 정문 전광판에는 `무재해 무사망` 일수를 뜻하는 숫자 392가 떠 있다. 하루가 갈 때마다 1이 더해진다. 이 숫자가 0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에,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없다. 철배를 만들기 위해 다치고 죽어가지만, 결국 철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이러니는 전광판 숫자에 가려진 진실을 알고 싶게 한다.
저자는 2005년 첫 소설집 `투견`을 시작으로, 16년간 스무 권이 넘는 소설을 발표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데뷔 작품 두 편을 14년 후 개작해 새로 출간하거나, `위안부` 피해자 증언 소설 연작 다섯 권을 묶어낸 독특한 이력도 있다. 이는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를 여전히 돌아보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김숨이라는 뿌리에서 태어난 이야기들은 그렇게 다시 새 가지를 뻗으며 넓어지고 깊어진다.이태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